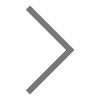지난 주말, 오랜만에 대학교 친구들을 만났다. 시작은 저녁 한 끼 먹자는 것이었지만, 맛있는 식사를 한 끼라도 더하자는 욕심에 우리는 이른 점심부터 만나 오랜만의 안부를 나눴다. 근황 얘기가 끊이지 않던 중 즉흥적으로 학교에 가지 않겠냐는 한 친구의 제안에 모두 들떠 당장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학교로 향했다.
택시에서 바라본 학교 앞은 변한 것 하나 없이 여전한 모습이었다. 그 모습이 반가워 모두 추억의 장소를 이리저리 가리키며 학교에 도착했다. 정문에 서 있는 낯익은 동상과 멀리 보이는 과 건물에 우리는 웃으며 연신 카메라 버튼을 눌러댔다. 늦여름의 산산한 바람이 괜스레 마음을 더 설레게 했다.
여기까지 왔으니 과 건물은 들어가야겠다는 생각에 우리는 한달음에 그곳으로 향했다. 그 길에 보이는 친구의 자취방에 또 한 번 우리가 나누었던 추억에 크게 웃으며 오르막이 힘든 줄도 모르고 한참을 걸었다. 도착한 그곳엔 졸업생들을 축하하는 현수막이 걸려있었고 코로나 학번이어서 졸업사진을 못 찍은 친구는 한을 풀겠다며 때늦은 졸업사진을 함께 찍었다.
하지만 졸업생인 이유로 굳게 닫힌 문을 넘을 수 없어 자동문에 붙은 채로 건물 안을 이리저리 둘러보았다. 로비에 교수님의 얼굴 사진이 붙은 입간판을 보며 한참을 웃었다. 그때 우리를 계속 수상하게 보시던 경비 아저씨께서 참다못해 나오셔서는 우리에게 무슨 일이냐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쭈뼛대며 졸업생이어서 학교를 구경 왔다고 말씀드렸다. 다른 과 학생들인 줄 알았다는 경비 아저씨의 말씀에 우리는 여전히 풋풋한 대학생 같아 보이는 것 같다며 뿌듯해하며 돌아섰다.

“현재가 가장 아름다운 법”
왜 학교는 다 산에 있는 건지 불평불만을 나누면서 오르막을 올라 도서관 앞에 도착했다. 주말 저녁임에도 불이 환하게 켜져 있는 도서관의 모습에 시험 기간에 밤을 새우던 날들에 대해 생각이 떠올랐다. 너도나도 학교 시험에 치이고 취업의 불확실성에 살던 날들에 관해 이야기하며 지금 직장인이 된 우리가 믿기지 않는다며 다들 호들갑을 떨었다.
신기하게도 당시에는 너무나도 힘들고 휴학과 불평불만을 입에 달고 살 정도로 힘들고 재미없기만 하루하루를 살았다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니 노력하던 나 자신이 기특하고 친구들과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말 그대로 청춘이라는 시간을 즐겼던 날들이 아니었을까 되돌아보게 되었다.
추억에 잠겨 웃다가 문득 마음 한구석에서 후회가 고개를 들었다. 내가 그 당시에 오늘을 감사하며 더 행복하게 살았다면 지금 그날을 돌아보는 내가 얼마나 행복할까? 당시에는 이 지겨운 학교에서 얼른 벗어나고 싶었고 내 하루하루는 왜 이렇게 재미없는지 불평만 하고 살았었다. 하지만 돌이켜보니 자취방, 학교, 도서관 그리고 친구들. 내 하루들이 모여 눈물이 나도록 아름다운 추억이 되어있었다.

“후회는 없지만, 미련은 있다”
친구들이 떠난 집에 앉아 혼자 생각했다. 나는 앞으로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할까? 이리저리 생각해보다 낸 결론은 “후회 없이 살자!”였다.
사람이 어떻게 후회 없이 살겠냐마는 최선을 다해서 오늘을 살면 비록 아쉬움은 남을지라도 후회는 없을 것이라는 확신이 그날 이후로 생겼다. 왜냐하면 오늘 나의 부정적인 감정들이 사실 뒤돌아보면 추억이라는 것을 이제는 배웠기 때문이다. 나는 오늘부터 주어진 하루에 감사하며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렇다면 언젠가 열어볼 추억이 차곡차곡 쌓여 나를 반겨주지 않을까?
인도에는 이런 말이 있다고 한다.
“과거에 사는 사람은 불행하며, 미래에 사는 사람은 불안하나 현재에 사는 사람은 행복하다.”
훗날의 내가 오늘로 여행을 왔을 때 아름다운 추억을 즐길 수 있도록 오늘도 행복하게 살아가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