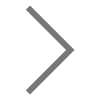버려지는 밀랍이 아까워 시작한 초 만들기
한국학을 전공한 빈도림 씨(2005년 귀화)와 독일문학을 전공한 이영희 씨는 통역가와 번역가로 각각 활동하다 2002년 서울 생활을 접고 전남 담양에 새 보금자리를 마련했다. 어느 날 부부는 한봉을 하는 농가에서 버려지던 밀랍을 발견했다. 밀랍은 벌이 분비하는 노란색 천연 왁스로, 벌은 밀랍으로 꿀 저장공간을 만든다. 우리나라도 밀랍으로 초를 만들어 사용했다. <조선왕조실록>에서도 밀랍에 대한 기록을 찾아볼 수 있다. 왕실 행사에서 수량을 엄격히 제한해 사용하고, 왕의 하사품으로 쓸 정도로 밀랍초는 굉장히 귀한 대접을 받았다. 그러다 원유를 정제할 때 생기는 부산물인 파라핀으로 만든 값싼 양초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밀랍초는 사라졌다.
부부는 취미 삼아 초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다.
“처음에는 버리지는 밀랍이 아까워 초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철없는(?) 생각이었죠. 심지로 어떤 실을 사용해야 하는지 알 수 없었죠. 실패를 거듭하면서 밀랍초 만드는 방법을 하나하나 터득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버리지는 밀랍이 아까워 초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철없는(?) 생각이었죠. 심지로 어떤 실을 사용해야 하는지 알 수 없었죠. 실패를 거듭하면서 밀랍초 만드는 방법을 하나하나 터득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밀랍초를 완성하고 주변에 선물을 하니 반응이 좋았다. 밀랍초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본격적으로 밀랍초 만들기에 나섰다. 그렇게 ‘빈도림꿀초’가 탄생했고, 밀랍초의 명맥이 이들에 의해 이어질 수 있었다. 부부는 대한민국에 밀랍초를 다시 선보였다는 데 자부심이 크다. 주문이 늘어나면서 기계가 필요했다. 첫 번째 기계는 우리나라 업체에 의뢰해 만들었지만 두 번째는 기계를 제작하겠다고 나서는 업체가 없어 중국 업체를 찾았다. 중국을 네 번이나 찾아 빈도림꿀초에서 필요한 기계를 완성할 수 있었다. 일부 공정에서만 기계의 힘을 빌리기 때문에 밀랍초를 고객에게 전달하기까지 손이 많이 갈 수밖에 없다. 특히 담금초는 녹인 밀랍에 심지를 40~50번 정도 담갔다 빼 식히는 과정을 반복하는, 느린 과정을 거쳐야 탄생한다.


색소, 향 첨가 없이 인체에 무해한 밀랍초
“밀랍초는 인체에 무해합니다. 어떤 색소나 향을 첨가할 필요가 없어요. 저희가 만드는 초는 노란 색에 은은한 꿀향이 배어있습니다.”
이와 함께 일회용 랩을 대신해 여러 차례 사용할 수 있는 밀랍랩도 제작해 한살림에 공급하고 있다.
“초를 켜면 마음이 차분해져요. 촛불에 시선과 마음이 모아지죠. 그래서일까요. 가톨릭은 물론, 개신교, 불교, 원불교, 무속신앙에 이르기까지 종교에서는 모두 초를 사용합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며 밀랍초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삶을 충만하게 만드는 방법 중 하나로 초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 역시 증가했다. 공방을 방문하지 않고도 직접 초를 제작해 볼 수 있는 DIY 키트에 대한 수요도 늘었다. 1996년 결혼한 부부는 한국과 독일이라는 공통분모가 있어 서로의 일에 도움을 줄 수 있었다. 담양 생활을 먼저 제안한 빈도림 씨는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선뜻 동의해 준 아내가 아직까지도 고맙다. 빈도림 씨의 취미는 요리다. 손님들을 초대해 음식을 나누며 사람들과 연결된,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있다. 2002년부터 밀랍초를 만들기 시작했으니 벌써 20년이다. 부부는 앞으로도 밀랍초를 만들며 소박한 삶을 이어나갈 계획이다.